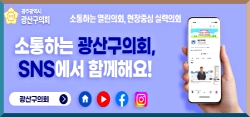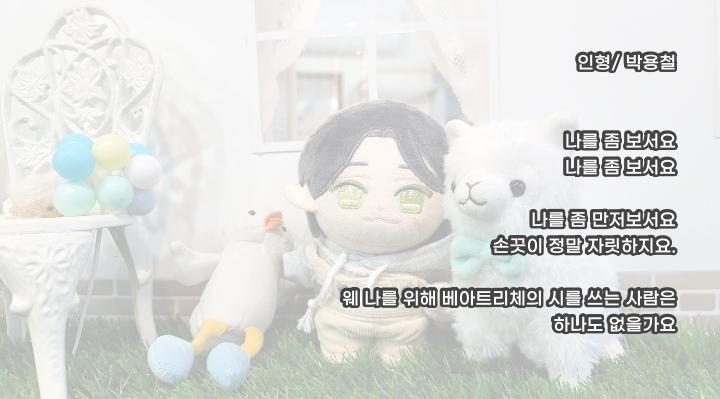|
그는 자신이, 아무도 그를 위해 ’베아트리체의 시‘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불행한 인형이 되어가고 있다고 여긴 걸까? 아니 어쩌면 병실 발치에서 까맣게 타들어 가는 입술을 꽉 물고 있는 가여운 정희가 그 인형인지도 몰랐다.
이제 그녀를 위해 베아트리체의 시를 써 줄 용아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용아가 폐환이 깊어질 무렵, 용아의 아버지 박하준도 병환 중이었다.
1937년 12월 중순, 용아는⌜동아일보⌟에 쓰기로 되어있던⟨정축년 회고; 시단⟩연평의 원고를 넘기고, 1938년 1월 1일 창간되는⌜삼천리문학⌟에 기고할 평론⟨시적 변용에 대해서⟩를 집필하였다.
용아는 ‘쓰지 않고는 죽어도 못 배길 그런 내심의 요구‘에 의지하여 마지막 집필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붓고 있었다. 공식적인 지면에 마지막으로 실린 글은 1938년 4월⌜삼천리문학 제2호⌟의 시⟨만폭동⟩이다. 그는 그의 음성을 잠식하고 호흡을 갉아먹는 결핵과의 투쟁 속에서 작년 지용과 함께 갔던 금강산, 백만 소리 속에 고요를 지키는 만폭동을 생각했던 것일까?
3월 24일자 영랑에게 쓴 편지에서 용아는 영랑의 형편을 더 걱정하면서 자신의 병을 빠른 치유를 포기하고 지구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것이 영랑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5월이 되자, 용아는 병원에서 사직동 자택으로 돌아와 최후를 맞으려는 것이다. 용아는 가슴이 타들어 가는 고통으로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5월 12일, 자택은 질식할 듯한 비통의 분위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희..... 용아의 벗이자 동지였고 문우였던 정희,
정희는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용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잡았다.
“편안하게 가세요.”
|
1938년 5월 12일 오후 5시, 우리 가운데 자라난 한 포기 나무같이 시인이었던 용아 박용철은 35세의 나이로 이승의 인연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고향 마을이 내려다뵈는 어등산에 ’앞 데일 언덕‘을 마련하였다.
시인 용아 박용철은
한 줄의 좋은 시를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시인이었다.
그는 72편의 자유시(동시〈색동저고리〉 포함). 12수의 시조 그리고 13수의 한시(번역 시조 13수) 등 총 100편의 시를 남겼다.
|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5.05.17(토) 15:05
2025.05.17(토) 15:05